상세 컨텐츠
본문

의병은 백성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쌓은 성벽돌이며,
자발적으로 지천과 틈에 피어난 들꽃들이다.
성벽은 오랜 세월 외침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온 공동체의 집합적 의지와 연대의 증거다. 하나하나의 돌은 정의와 헌신, 그리고 치열한 역사가 켜켜이 쌓여 남은 기록이다. 돌 사이의 ‘틈’은 또 다른 성벽의 본질을 구성한다.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내리고 피어나는 야생화는 틈이 지닌 가능성을 증명하며, 의병의 역사는 그 틈에서 태어난 야생화의 생애와 닮아 있다. 제도적 기반이나 외부의 보호 없이, 나라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 스스로 일어나 공동체를 지킨 정신이 틈에서 피어난 야생화와 같다.

따라서 ‘틈’은 단순히 작고 미세한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기억이 스며들며, 자생의 힘이 드러나는 자리다. 성벽이 공동체의 의지를 쌓아 올린 기록이라면, 그 사이의 틈은 의병의 정신이 태어나고 이어지는 근원이다. 의병기념관은 이러한 틈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

옛 성곽이 산맥을 따라 흐르듯, 기념관은 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지형의 맥락을 존중하며 자연과 호흡하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내부 공간은 외부 자연과 끊임없이 이어지며, 경계를 허물어 조화를 이룬다.

관람 동선은 곧 의병의 여정이다. 이 길은 자유로운 배회가 아닌, 필연적인 길로 인도하듯 이어진다. 관람객은 성벽을 따라 난 길과 같이 흐름을 따라 정해진 순서를 밟아가며 기억을 되새긴다.

이 여정은 전이 공간에서 시작해 기억의 숲을 거치며 완성된다. 전이 공간은 여정을 준비하는 마당이자 쉼의 자리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기억의 숲은 길의 중심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가 된다.

대지는 본래 숲과 물길이 어우러진 자연의 무대였으며, 기념관은 그 흐름을 존중해 앞마당과 안마당을 품어냈다. 홍예공원으로 열린 앞마당은 현재의 삶과 도시의 풍경을 담아내고, 기억의 숲을 향한 안마당은 전시실·회랑·기획 전시실로 이어지는 감정의 울림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비록 전시관은 기능별로 분동되어 있으나, 브릿지와 회랑, 데크가 흩어진 기억을 엮어 관람자의 감정을 하나로 이어준다. 두 마당은 서로를 마주하며, 사람과 자연, 그리고 시간이 교차하는 자리에 기념관이 놓였다.


기억의 숲과 건천의 자연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은 자연을 감싸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관리자와 관람객의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공용공간은 의병기념관 본동과 이격 배치하고, 전체는 분동형으로 구성하였다. 관람객은 이렇게 분절된 매스를 따라 자연을 조망할 수 있고, 어린이 체험공간은 폴딩도어를 통해 자연을 받아들이는 생태적 체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1층에서 3층까지 이어지는 열린 아트리움은 전시실로 향하는 주요 동선이자, 관람의 시작을 알리는 인트로 전시공간으로 기능한다.


관람객 주차장에서 보훈관까지는 하나의 레벨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로 [루]를 계획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단차 동선을 형성하였다. 이 루는 기억의 숲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길을 따라 걸을 때 홍예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 외부 공간을 제공한다. 관람객은 루 위를 거닐며 외부 전시를 체험하고, 추모의 순간을 갖는 동시에, 전이공간을 통해 보훈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교육 영역인 세미나실은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주차장에서 온 관람객은 루를 통해 바로 전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각 전시관은 역사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인 동선을 따르며, 전시관 사이의 이격으로 형성된 전이공간은 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동시에 휴식의 장소이자 중정을 통해 실내외 전시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또한 전시관과 게비온 사이에도 이격을 두어 야외 전시공간을 마련하였고, 게비온 틈새로 스며드는 빛줄기와 그 사이에 피어난 야생화는 색다른 전시 경험을 연출한다.



관람객은 루를 따라 수평과 수직으로 이동하며, 내부에서는 자연을 품은 공간과 기억의 숲을 조망하며 다채로운 전시공간에서 관람하며, 외부에서는 성벽돌, 대지의 흙, 자연의 나무 같은 재료가 어우러져 감각적 전시와 추모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결국 게비온의 질감과 녹지의 풍경은 전시의 흐름과 겹쳐지며, 관람객에게 의병 역사의 시간 속을 걷는 듯한 감각을 전달한다.



외부 공간은 기억의 숲 [안마당]과 새롭게 조성되는 홍예공원 [앞마당], 그리고 의병기념관의 공공 보행로 [루]와 [연결 브릿지]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앞마당은 열린 품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안마당은 깊은 사유와 추모를 품는다. 두 공간의 중심에는 건물 중간층에 자리한 루가 놓여 있다. 루는 양쪽으로 시선을 열어주며, 감각의 공간인 외부 전시관과 추모·기억의 공간,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장을 함께 담아낸다.


보훈관은 전쟁과 항쟁의 흔적이 세대를 넘어 공명하는 희생의 울림이다.

고요한 물 위에 번진 작은 떨림이 마침내 강 전체를 흔들 듯, 의병의 파동은 독립운동의 물결로 번져 세대를 건너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된다. 한 사람의 외침은 메아리처럼 퍼져 시대를 가로질렀고, 그 울림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흔드는 함성으로 모였다. 그 안에서 이름 없는 군중의 발걸음, 민족대표의 결단, 광복군의 숨결,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의 눈물까지 모든 순간이 얽혀 깊은 공명을 이루었고,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희생의 울림으로 모여들었다.
그 울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메아리치며, 보훈관은 그렇게 ‘살아 있는 울림의 장’이 된다.

의병기념관과 보훈관은 브릿지를 통해 서로 이어지며, 관람객은 그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보훈관으로 진입한다. 진입 동선은 카페와 충혼탑으로도 연결되어 있어 잠시 머무르거나 추모의 공간을 먼저 찾을 수도 있다. 이어지는 전시는 잔잔히 울리는 희생의 울림 속에서 그날의 떨림과 총성, 그리고 마음을 깊이 흔드는 울림을 체험하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전시관이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이 동선은 어느 한 장면에 머물기보다는 역사 전체를 몸으로 감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람객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과거의 험난한 여정을 되새기는 행위가 되고, 흐름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1층의 아웃트로 전시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루로 다시 진입해 추모의 시간을 가진 뒤 여정을 마무리하며, 기억의 파동은 다시 오늘의 우리에게로 이어진다.


관람객은 주차장에서 기념관으로 오르는 길 위에서 단순한 진입이 아닌, 작은 전시 장면들이 차례로 드러나는 서사의 통로를 걷게 된다. 루를 따라 이어지는 공간은 내외부를 잇는 틀로 작동하며, 전시와 풍경이 교차하는 순간이 펼쳐진다. 풍경 속에 스며든 전시는 건축의 틈과 어우러져 감각의 깊이를 확장하고, 길과 마당, 숲과 탑을 오가는 여정은 의병정신이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서사로 완성된다.

'PROJEC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갈매역세권 유치원 설계공모 (0) | 2025.11.04 |
|---|---|
| 인천 반다비체육관 설계공모_당선 (0) | 2025.09.11 |
| 인제우체국 건립공사 (0) | 2025.06.13 |
| 대전사회복지회관 기획디자인 국제설계공모_당선 (0) | 2025.05.08 |
| 인천 다목적훈련장 건립사업_당선 (0) | 2025.03.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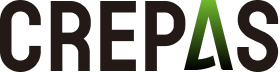





댓글 영역